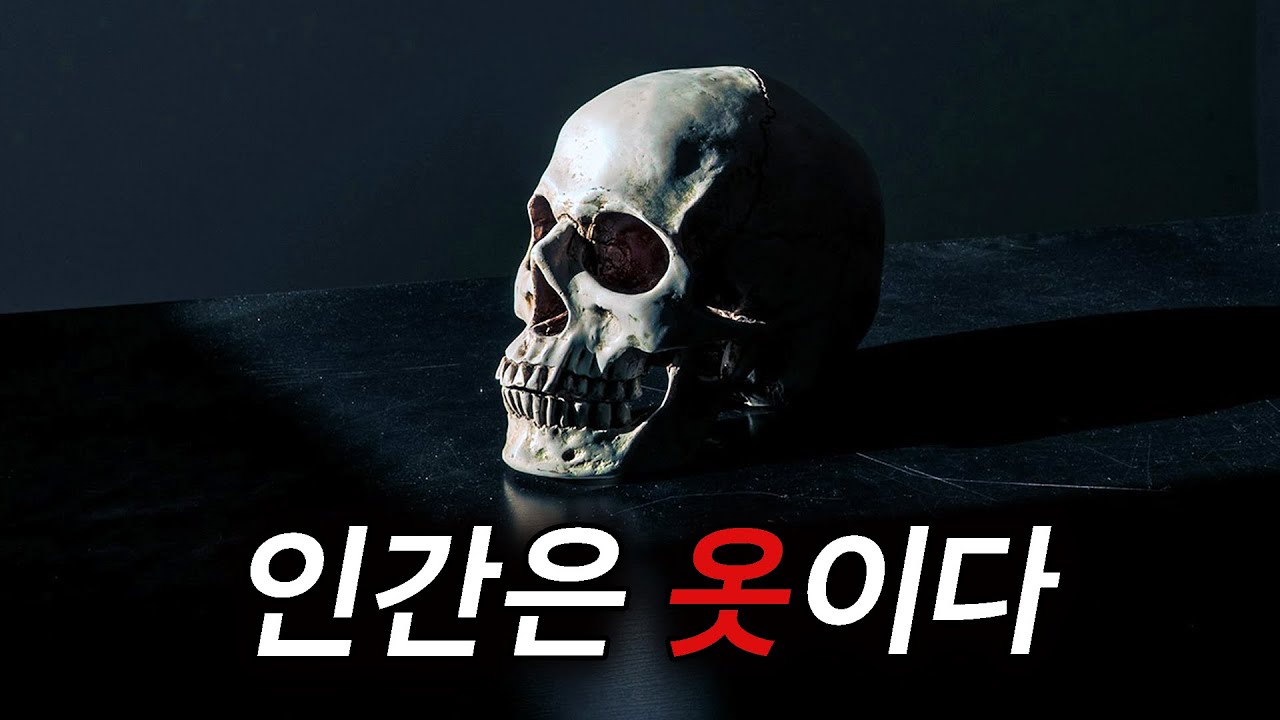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착각'이 유물론이고, 그래서 내면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 정말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측정 가능한 것들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잖아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날수록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이나 문득 드는 알 수 없는 생각들은 비과학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해버리기 쉽죠. 아니면 그저 호르몬이나 뇌 화학 작용의 결과라고 축소시키거나요.
영상에서 '의식'은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보는 능력'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그 '보는 나' 자체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는 나'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조차도 그저 눈을 감았다 뜨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비유도 신선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여러 상황을 겪지만, 결국 꿈을 꾸는 '나'는 그대로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거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도 현실적이면서도 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심해에 닿았어도 수면 위의 파도는 여전히 친다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내면의 평온을 찾았더라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사람들과 부딪히고, 돈을 벌어야 하고, 감정의 기복을 겪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해, 즉 내면의 고요함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겠죠.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괴로워하는 것과, 이것이 마음의 이원성 때문에 발생하는 '윤회'의 문제임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려 노력하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요.
결국 영상이 말하고 싶은 건, 세상의 기준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의 진실, 즉 변치 않는 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자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야 비 오는 날에도 비를 사랑하고, 젊어서도 젊음을 사랑하고, 늙어서도 평온을 사랑할 수 있는 '훌륭한 여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팬픽션 속에서 누군가와 설레는 연애를 상상하고, 좋아하는 캐릭터에게 몰입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것도 어쩌면 내면의 어떤 갈망, 즉 관계 속에서의 따뜻함, 이해,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채우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완벽한 관계를 찾기 어려울 때, 이야기 속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그것 역시 결국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테고요.
결국 철학이든, 소설이든,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헤매는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나, 더 행복한 삶을 향한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설레는 이야기도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